대학 2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그 해 겨울 입대했다. 그리고 맞이한 군대에서의 첫 여름, 특히 군대에서 졸병의 여름은 지금처럼 머리꼭지에서 김이 푹푹 날만큼 무척이나 더웠다.
나름 요령피우지 않고 착실한 졸병 생활을 보내던 나는,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음식 쓰레기) 처리를 맡아 하시는 농장 아저씨의 논으로 이른 바 ‘대민 지원’을 자주 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중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행정보급관님(계급 상 중대장이 말 그대로 중대의 장이지만, 군대의 현실은 사실 조금 다르다)과 그 아저씨의 친분이 돈독하여 이뤄진 ‘대민 지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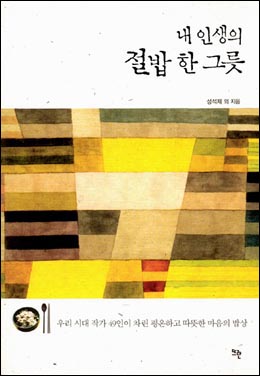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커넥션이나 비리 따위로 비난할 것도 아니었다. 잔반은 어차피 처리해야 했고, 논이든 그보다 더한 ‘지옥’(!)이든 우리들은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으니.
주 임무는 모내기였는데, 지원을 나간 이들 중 막내였기에 그 곳에서도 나는 요령 같은 것은 피울 재간이 없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논바닥에 얼굴을 들이밀고 ‘폭폭’ 찔러 넣기를 반복할 수밖에….
나의 근면함(!) 덕분에 농장 아저씨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된 나는, 단지 부대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부대원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름 대민지원의 전담 요원이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내가 이른 바 짬밥이 차 굳이 부대 밖이 그립지 않을 때에도, 즉 그 다음 해 여름에도 자주 대민지원을 나가야 했다는 것이지만. 뭐 암튼.
무엇보다 대민지원의 하이라이트는 ‘밥’일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 농장 아주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들고, 논두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LTE급 속도로 사제 밥(!)을 먹어치웠던 기억. 풋고추와 된장, ‘사제 김치’와 가끔씩 나오던 돼지보쌈,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하늘은 몸살 나게 푸르렀고, 달게 배부른 우리들은 그토록 젊음에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작가 49인이 써내려간 ‘밥의 찬가’이다. 찬찬히 읽다보면 문득 ‘내 인생의 밥 한 끼’는 언제였던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나를 위로했던가, 아련해진다.
시인 김사인은 책에서 ‘밥을 모신다’고 표현했다. 밥의 소중함이 점점 잊히는 지금, 각자의 소중한 한 끼 밥상을 ‘모셔보는’ 것은 어떨까.
나? 물론 내 인생의 찬란한 밥 한 그릇은 작대기 두 개 달고, 논바닥에 앉아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그 여름날의 밥이었다.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대자로 누워 바라본 그 하늘의 눈부신 푸르름을 어찌 잊을까.

